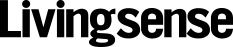김도훈의 집과 낭만 38
좋아하는 디자이너의 얼굴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둔 나라는 사람.

꼼데가르송을 좋아한다. 꼼데가르송을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다. 꼼데가르송은 인류 역사상 일본이 창조해 낸 최고의 브랜드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브랜드는 잘 없다. 브랜드의 역사책 ¼ 분량을 차지할 법한 일본 브랜드라도 그렇다. 1980년대만 해도 소니는 꿈이었다. 일본의 꿈만은 아니었다. 세계의 꿈이었다. 한국의 꿈이었다. 소니 워크맨을 지닌 자의 계급은 삼성 마이마이를 가진 자의 계급보다 높았다. 나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소니가 삼성보다 유명했어요?”라는 Z세대의 질문과 마주치곤 한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 감격적이다.
1990년대에도 여전히 소니는 강력했다. 우리 집 거실에도 소니 텔레비전이 있었다. “역시 가전제품은 소니 아이가”라던 1948년생 아버지의 선택이었다. 고베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이라 일본 사랑이 끝이 없었다. 2000년대 중반 우리 집 거실 텔레비전은 삼성으로 바뀌었다. “역시 가전제품은 삼성이지”라던 아버지와 “그래도 엘지가 좋다카던데”라는 어머니의 전쟁에서 삼성이 승리했다. 소니, 파나소닉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그렇다. 나는 국뽕을 경계하는 예민한 글쟁이임에도 이 문단을 쓰면서 약간의 국뽕을 마시고 있다. 독자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아니다. 국산 브랜드의 승리에 대한 글을 쓰려는 건 아니다. 꼼데가르송이 나의 현재 재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하려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꼼데가르송은 소니도 파나소닉도 다 영향력을 잃어가는 와중에 끝끝내 살아남은 내가 좋아하는 일본 브랜드다. 그게 문제다. 내가 30대 10년간 돈을 모으지 못하고 여전히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쉰 살 글쟁이가 된 이유가 바로 꼼데가르송의 끈질긴 생명력에 있기 때문이다.
20대와 30대 내내 나는 꼼데가르송에 완전히 현혹된 젊은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문제다. 꼼데가르송은 하이엔드 브랜드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특징은, 가격도 하이엔드라는 것이다. 20대의 나는 일본 잡지를 보면서 꼼데가르송을 염원했지만 단 한 벌도 사질 못했다. 내가 20대를 보내던 1990년대 엔화의 환율은 소름 끼칠 정도로 높았다. 일본 여행을 가는 것은 세계 여행 중 스위스와 함께 최고의 사치 중 하나였다. 이런 말을 하면 또 Z세대 독자들이 물을 것이다. “가깝고 싸서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일본이요?” 나는 여러분이 부럽다. 여러분은 원화 환율에 있어서라면 한국 역사상 최고의 호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 시절 꼼데가르송을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30대가 되자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돈을 벌기 시작한 덕이다. 역시 문제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잡지사라는 곳은 연봉이 잡스러울 정도로 낮았다. 꼼데가르송은 여전히 하이엔드였다. 여전히 비쌌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본 여행을 가면 꼼데가르송의 저가 라인인 ‘플레이 라인’을 샀다. 눈깔 달린 하트 모양 로고가 박혀 있는 바로 그 라인이다. 나는 쓸모없을 정도로 패션에 있어서라면 자존심이 셌다. 이왕 꼼데가르송을 사야 한다면 그건 ‘꼼데가르송 옴므’나 적어도 ‘준야 와타나베’ 라인이어야만 했다. 이래서 돈 없고 취향 있는 자의 인생이 각박한 것이다.
처음 꼼데가르송 옷을 산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까만 나일론 바지였다. 꼼데가르송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꼼데가르송인지 뭔데가르송인지 알 리가 없는 옷이다. 그것이야말로 꼼데가르송이라는 브랜드의 진수다. 오로지 자신이 만든 옷만 입는 꼼데가르송 설립자 레이 가와쿠보는 언론 노출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내향인이다. 그래서 반세기를 일하면서 찍힌 사진도 몇 없다. 드물게 찍힌 사진에서 그는 항상 검은색 꼼데가르송 나일론 바지만 입고 있다. 그러니 꼼데가르송의 진정한 팬이라면 무조건 특징 없는 그 바지부터 사야 하는 것이다. 꼼데가르송은 여전히 실험적인 디자인을 내놓은 아방가르드의 최전선이지만 의외로 그 진수를 담은 옷들은 입는 순간 수줍은 검은색처럼 입는 자의 스타일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진다. 나는 그 아이러니가 정말 좋았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꼼데가르송이 되는 것이 바로 꼼데가르송의 옷이다. 그 옷을 만든 레이 가와쿠보와 똑 닮았다.
수줍다고 덜 비싼 건 아니다. 꼼데가르송 나일론 바지는 한국에서 한 벌에 50만 원 정도였다. 그게 2000년대 중반이었으니, 잡지사에서 일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자 나부랭이가 거침없이 카드를 내밀기에는 거침없이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카드의 모든 빚 동원력을 동원해 끊임없이 꼼데가르송 바지를 샀다. 2010년대가 오자 내 옷장은 누가 봐도 그냥 같은 옷처럼 보이는 꼼데가르송 바지가 스무 벌을 넘어섰다. 물론 바지만 산 것은 아니다. 셔츠도 샀다. 신발도 샀다. 쇼핑은 개미지옥이다. 한 번 비싼 걸 사게 되면 그보다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담력이 는다. 재정력은 그대로인데 담력만 는다. 인간은 정말이지 이성적이지 못한 존재다.
꼼데가르송을 미친 듯이 옷장에 욱여넣던 시절, 나는 레이 가와쿠보의 모든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에 관련된 몇 안 되는 책을 이베이로 구입했다. 역시 비싸게 구입했다. 이놈의 브랜드는 컬트적인 팬이 많아서 컬트적인 아이템도 많고 컬트적인 아이템을 컬트적인 가격으로 되파는 컬트적인 팬도 많다. 그러다 나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짓을 하기로 결정했다. 레이 가와쿠보의 사진을 프린트해 액자에 넣어 벽에 거는 짓이다. 나는 이런 짓을 정말 싫어한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타인의 사진을, 오로지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내 집에 거는 것은 정말이지 초라하고 민망한 일이다. 예전 제법 돈 많고 근사한 양반 집에 거대하게 걸려 있는 일론 머스크인가 마크 저커버그의 사진을 인터넷으로 보고 나는 그 양반의 취향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차라리 침실 벽 한가운데에 거대하게 걸려 있는 웨딩 포토가 덜 민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레이 가와쿠보의 사진을 액자에 넣는 순간, 나는 마크 저커버그고 오바마고 누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사진을 거는 행위를 멸시하길 그만뒀다. 세상에는 많은 취향이 있다. 좋은 취향도 있을 것이다. 나쁜 취향도 있을 것이다. 좋고 나쁨의 경계는 시대에 따라 흐려지곤 한다. 나는 인테리어 관련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구독하고 있다. 특히 LA에 나온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채널을 자주 본다. 1970년대 미드센추리 스타일을 그대로 간직한 집들이 요즘 그 동네에서 꽤 인기다. 채널 주인장들은 디스코 시절의 사이키델릭한 벽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집을 소개하며 “시간이 그대로 보존된 멋진 집입니다”라고 감탄한다. 나는 가격에 감탄한다. 아니다. 탄식이라고 해야 옳겠다.
사실 2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집은 그리 인기가 없었다. LA의 많은 미드센추리 스타일 집들은 신흥 IT 부자들의 포스트모던한 취향에 맞춰 헐리고 리모델링됐다. 미니멀한 하얀 상자로 변했다. 지금은 다르다. 모두가 미드센추리 스타일의 집을 원한다. 박찬욱 영화에 나올 법한 사이키델릭한 벽지는 더는 과거의 나쁜 취향이 아니다. 개성을 지닌 현재의 좋은 취향이 됐다. 좋아하는 인물 사진을 벽에 거는 행위도 그렇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춘기 시절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 사진을 벽에 붙인 뒤 “정신 사납고 공부도 안 되고 벽지 상하게 왜 그런 사진을 잘 뜯어지지도 않는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냐”는 어머니의 불평에 시달리며 컸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훌륭하고 성숙하고 독립적인 어른이 된 지금이야말로 좋아하는 사람 사진을 벽에 마음껏 붙이고 걸고 살 기회다.
레이 가와쿠보의 사진은 여전히 이 글을 쓰고 있는 데스크 옆자리에 놓여있다. 나는 요즘 꼼데가르송 옷을 거의 사지 않는다. 살이 찌니 그놈의 일본 브랜드 옷은 도무지 입어낼 수가 없다. 소식좌만 사는 나라 디자이너들은 나 같은 몸을 지닌 사람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닌가 싶다. 레이 가와쿠보 사진의 의미도 조금 달라졌다. 지금 그녀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꼼데가르송을 입어내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날이 마침내 온 것이다.
김도훈 @closer21
오랫동안 <씨네21>에서 영화 기자로 일했고, <GEEK>의 패션 디렉터와 <허핑턴포스트> 편집장을 거쳐 《이제 우리 낭만을 이야기 합시다》라는 책을 썼다. 평생(?)에 걸쳐 수집한 물건들과 아름다운 물건들이 공존하는 그의 아파트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김도훈 나라다.
editor심효진
words김도훈
-
Array
(
[idxno] => 7596
[url] => /news/articleView.html?idxno=64328
[title] => 다채로운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3인
[target] => _self
[article_idxno_self] => 64294
[article_idxno_target] => 64328
[sort] => 0
[default_img] => 202504/64328_61848_1332.png
)
- 다채로운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3인 Array ( [idxno] => 7726 [url] => /news/articleView.html?idxno=64393 [title] => 압도적인 나르시시스트만이 할 수 있는 일 [target] => _self [article_idxno_self] => 64294 [article_idxno_target] => 64393 [sort] => 1 [default_img] => 202505/64393_62150_5350.jpg )
- 압도적인 나르시시스트만이 할 수 있는 일 Array ( [idxno] => 7898 [url] => /news/articleView.html?idxno=64470 [title] => 전망 좋은 집-김도훈의 집과 낭만 [target] => _self [article_idxno_self] => 64294 [article_idxno_target] => 64470 [sort] => 2 [default_img] => 202506/64470_62630_4545.jpg )
- 전망 좋은 집-김도훈의 집과 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