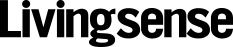김도훈의 집과 낭만 39
나의 유일한 웨딩 포토
집에 자기 사진을 크게 걸어놓는 건 압도적인 나르시시스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부모님 댁에 가면 가족사진이 걸려 있다. 지난달 부산에 내려갔다가 그걸 보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니, 엄마. 저 사진은 나 대학 때 찍은 거 아니유. 20세기 사진이 왜 아직도 걸려 있는 건지 모르겠네. 새로 찍든가 합시다.” 어머니가 말했다. “새로 찍으면 좋은데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걸 찍을 시간이 어딨니?” 동생이 말했다. “뭐 옛날 사진이라 다 젊고 좋네.” 나는 좋지 않다. 1990년대 중반에 찍은 사진이다. 나는 당시 유행하던 가수 김원준 스타일의 중간 가르마를 하고 있다. 젤을 어찌나 발랐는지 중간 가르마 양옆 머리가 카메라 플래시를 받아 반짝거린다.
옛날 사진을 보면 가장 끔찍한 건 언제나 헤어스타일이다. 옷은 어쩔 도리가 없다. 가족사진에서 나는 당시 유행하던 그런지 스타일 체크 셔츠 위에 랄프 로렌 스웨터를 입고 있다. 1990년대 스타일이 다시 유행하는 요즘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차림이다. 다만 헤어스타일은 참을 수가 없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젤을 발라 중간 가르마를 만든 다음 헤어스프레이로 빳빳하게 굳힌 머리를 하고 다니는가 말이다. 당시 쓰고 다니던 알 없는 초록색 안경이 없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당시 나의 스타일 구루는 김원준이었다. 김원준이 예능프로그램에 초록색 안경을 쓰고 나온 것을 봤다. 다음 날 부산의 패션 중심가 서면으로 달려가 모든 안경점을 뒤졌다. 옅은 초록색 안경이 딱 하나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걸 산 걸 후회하고 있다. 초록색 안경이라니, 그런 건 아무나 써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빨간 안경이 그렇다. 그건 빨간 안경으로 아이콘이 된 이동진 영화평론가만이 소화 가능한 아이템이다. 초록색 안경도 마찬가지다. 그걸 쓴 건 김원준이었다. 1990년대 중반 세상 모든 남자는 김원준이 되고 싶어 했다. 김원준이 되고 싶다고 해서 김원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두 잠든 후에나 꿈속에서 김원준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초록색 안경을 나에게 판 안경점 사장님은 단발의 송혜교 사진을 내미는 손님에게 따끔하게 말하는 미용실 사장처럼 나에게 말했어야 한다. “손님, 그건 김원준이잖아요.”
나는 집에 사진을 걸어놓지 않는다. 예외라면 지난달 이 칼럼에서 이야기한 일본 패션 브랜드 꼼데가르송 디자이너 레이 가와쿠보의 사진, 그리고 사진작가 레스(Less) 전시회에서 구입한 작품이다. 내 사진은 아니다. 가족사진도 아니다. 나는 자기 사진을 크게 거실에 걸어놓는 건 압도적인 나르시시스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르게 그걸 깨달았다. 친구 아버지는 부산 시의원 선거에 두 번이나 도전했다가 낙마한 지역 유지였다.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를 반긴 건 친구 아버지의 거대한 사진이었다. 그 거대함이 어느 정도인지 독자 여러분은 짐작조차 못 할 것이다. 벽에 걸어둔 커다란 결혼사진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거대한 사진이었다. 심지어 웃고 있었다.
친구가 말했다. “시의원 선거 나갔을 때 찍으신 거야.” 이름이 네 글자였다. 그렇다. 사진에 이름도 박혀 있었다. 친구가 설명했다. “그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호야, 호.” 여러분,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MZ세대라면 ‘호’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다. 호(號)는 유교 문화권에서 본명 이외에 따로 지어 부르는 이름을 말한다. 이를테면 다산 정약용의 ‘다산’이 호다. 대개는 옛 역사적 인물들이 호를 이름 앞에 붙였다. 나는 1990년대의 사람이 이름 대신 호를 사용하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정말이지 압도적인 나르시시스트임이 틀림없었다. 높이 2m가 넘는 자기 사진을 거실 벽에 걸어두는 사람이라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수가 없다. 다행히 친구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사실 나는 웨딩 포토를 침실 벽에 거대하게 걸어놓는 것도 좀 괴상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신혼의 사랑을 나누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한 메이크업을 한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웨딩 포토 속에서는 72kg이던 남편이 98kg의 몸무게를 한 채 떡진 머리나 기름진 머리로 냄새를 풍기며 옆에 누워 있는 걸 매일 비교해 보는 게 재미있는 일인가? 모르겠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할 일도 없으므로 웨딩 포토를 침대 위에 걸어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도리가 없다. 사실 알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감정이라는 게 있다. 다만 알고 싶은 감정은 있다. 이르게 이혼을 하게 된 부부가 벽에 걸린 거대한 웨딩 포토를 떼어내는 순간의 감정 같은 것 말이다. 그걸 어떻게 버려야 할까? 요즘 나는 소설을 한 번 써볼까 생각 중인데, 웨딩 포토를 처리하는 과정을 담은 단편이 갑자기 떠오르는 중이다. 쓰게 되면 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친구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다. 작은 스탠드형 액자다. 오렌지색이다. 내가 오렌지색 물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이미 이 지면으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 〈리빙센스〉를 구독한 지 얼마 안 된 독자라면 홈페이지에서 지난 글을 찾아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어쨌든 액자는 정말이지 센스 있는 선물이었다. 문제가 있었다. 나에게는 실물 사진이 거의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나의 가장 중요한 물건 중 하나는 사진첩이었다. 디지털카메라라는 것이 발명되기 전의 일이다. 모든 사진은 필름카메라로 찍었다. 현상소에 맡겨놓고 어떤 사진이 찍혔을지 며칠을 궁금해하다가 받으면 절반은 포커스가 나가 쓸모가 없는 사진들이었다. 돌아보니 꽤 로맨틱한 일이다. 요즘은 필름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일이 없다. 디지털카메라로 찍는 일도 잘 없다. 모든 사진은 아이폰 속에 있다.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의 문제가 하나 있다. 아니, 모든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문제다. 사진 숫자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다. 실물 사진으로 뽑아 액자에 넣을 만큼 좋은 사진은 별로 없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시절에는 한 장 한 장 정성을 들였다. 필름 한 통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 숫자는 24장이나 36장밖에 되질 않았다. 현상비를 생각하면 한 장 한 장이 돈이다. 한 장을 찍을 때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다. 지금은 그냥 찍는다. 조명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포즈가 어떻고 아무 상관 없이 찍는다. 어차피 우리는 사진을 손바닥 안 스마트폰으로만 본다. 한 번 찍은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뒤 그냥 잊힌다. 선물로 받은 오렌지색 액자는 아무런 사진도 품지 못한 채 배고픔에 시달리며 1년을 내 책상 위에 공허하게 놓여 있었다.
얼마 전 책장 정리를 하다가 사진을 한 장 발견했다. 10년도 더 전에 아는 포토그래퍼가 찍어서 현상해 준 사진이다. 젊은 나와 내 고양이 사진이다. 나는 30대 후반이었다. 지금은 열여덟이 된 내 고양이는 여덟 살 남짓이었다. 고양이는 늙지 않았다. 나만 늙고 살쪘다. 나는 그 사진을 오렌지색 액자에 넣었다. 크기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나와 고양이의 젊음이 사진 속에 있다. 우리 관계는 조금 변했다. 고양이도 중년을 넘어가면 잔소리 많은 남편이나 아내 같아진다.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거나 물이 신선하지 않으면 다짜고짜 잔소리부터 시작한다. 10년 전에는 고양이가 잔소리를 하면 무슨 문제라도 있나 노심초사했다. 요즘은 그냥 이불을 뒤집어쓰고 고양이에게 말한다. “아 화장실은 있다가 치우고 간식도 있다가 줄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건 결혼 생활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아는 사이가 됐다. 서로를 더 잘 알다 보면 걱정은 오히려 줄어든다. 관심도 오히려 줄어든다. 그는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다. 18년째 곁에 있다. 사랑이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로의 관계는 그저 공기가 됐다. 물이 됐다. 보이지 않지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다. 결국 나는 오렌지색 액자에 내 인생의 유일한 웨딩 포토를 넣은 것이다. 인생은 다 똑같다.
김도훈 @closer21
오랫동안 〈씨네21〉에서 영화기자로 일했고 〈GEEK〉의 패션 디렉터와 〈허핑턴포스트〉 편집장을 거쳐 《이제 우리 낭만을 이야기합시다》라는 책을 썼다. 평생(?)에 걸쳐 수집한 물건들과 아름다운 물건들이 공존하는 그의 아파트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김도훈 나라다.
editor심효진
words김도훈
-
Array
(
[idxno] => 7725
[url] => /news/articleView.html?idxno=64294
[title] => 액자에 두고 감상하고 싶은 얼굴
[target] => _self
[article_idxno_self] => 64393
[article_idxno_target] => 64294
[sort] => 0
[default_img] => 202503/64294_61659_225.jpeg
)
- 액자에 두고 감상하고 싶은 얼굴 Array ( [idxno] => 7727 [url] => /news/articleView.html?idxno=64203 [title] => 징글징글하게 닮아 있는 가족의 취향에 대하여 [target] => _self [article_idxno_self] => 64393 [article_idxno_target] => 64203 [sort] => 1 [default_img] => 202503/64203_61209_237.jpeg )
- 징글징글하게 닮아 있는 가족의 취향에 대하여 Array ( [idxno] => 7729 [url] => /news/articleView.html?idxno=64117 [title] => 쇼핑몰 앱은 지웠지만 [target] => _self [article_idxno_self] => 64393 [article_idxno_target] => 64117 [sort] => 2 [default_img] => 202502/64117_60805_538.jpg )
- 쇼핑몰 앱은 지웠지만 Array ( [idxno] => 7896 [url] => /news/articleView.html?idxno=64470 [title] => 전망 좋은 집-김도훈의 집과 낭만 [target] => _self [article_idxno_self] => 64393 [article_idxno_target] => 64470 [sort] => 3 [default_img] => 202506/64470_62630_4545.jpg )
- 전망 좋은 집-김도훈의 집과 낭만 Array ( [idxno] => 7996 [url] => /news/articleView.html?idxno=64529 [title] => 불멸의 캣 타워 [target] => _self [article_idxno_self] => 64393 [article_idxno_target] => 64529 [sort] => 4 [default_img] => 202507/64529_62878_3534.jpeg )
- 불멸의 캣 타워 Array ( [idxno] => 8092 [url] => /news/articleView.html?idxno=64648 [title] => 김도훈의 집과 낭만 42 [target] => _self [article_idxno_self] => 64393 [article_idxno_target] => 64648 [sort] => 5 [default_img] => 202508/64648_63501_1159.jpeg )
- 김도훈의 집과 낭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