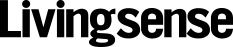왜 이별은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 한솔로 안녕.
고양이가 죽었다.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것이다. 소용없다. 내 고양이는 죽었다. 18년을 함께한 내 고양이는 죽었다. 징조는 없었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간식까지 먹은 뒤 갑자기 쓰러졌다. 뒷 다리를 쓰지 못하고 가쁜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고양이를 캐리어에 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으로 갔다. 차 안에서도 고양 이는 울지 않았다. 이놈의 고양이는 어디 가는 걸 너무 싫어해서, 차에 타 고 있는 동안 목이 쉬도록 울어 젖혀서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습성 이 있었다. 울지 않았다.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추석 전날이었다. 고 향 갈 계획은 없었다. 오랜만에 고양이를 품에 끼고 놓친 넷플릭스 시리 즈나 볼 생각이었다. 추석은 멈췄다.
고양이를 응급실로 보내고 병원 소파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30분 뒤 의사를 만났다. 내 MBTI는 INFP다. 사람 얼굴을 보고 미묘한 감정은 물론 사주팔자까지 파악할 수 있는 쓸모없는 초능력이 있다. 피곤한 성격이다. 의사를 보자마자 이미 나는 알았다. 주사 맞고 링거 좀 맞으면 나을 상황이 아니었다. 심장이 약해졌을 거라고 했다. 혈전이 갑자기 생겨서 동맥을 막았다고 했다. 뒷다리로 피가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혈전을 없애는 약을 투여한다고 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늙은 고양이가 앓 는 신장병은 없었다. 다행이 아니었다. 확률은 50%라고 했다. 혈전이 없 어져도 약이 너무 독해서 신장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다. 신장이 괜찮아 서 버티는 거라고 했다. 버텨도 50%라고 했다.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다. 울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대학 시절 캐나다 어학연수를 갔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거의 10시간을 울긴 했다. 옆자리 대만 여자가 손수건을 건넸다. 그냥 쓰라고 했다. 거기 코를 풀고 계속 울 었다. 운 이유는 하나였다. 한국에 돌아가기가 너무 싫어서 울었다. 영화 를 보고 운 적은 있다. 문제는 내 눈물샘을 건드리는 영화가 하필 윤제균 감독의 영화라는 것이다. 고상하게 슬픈 영화를 볼 때는 터지지 않는 눈 물샘이〈국제시장〉을 보고 터졌다.〈해운대〉를 보고도 울었다. 이런 이 상한 이유들을 제외하면 나는 울어본 적이 거의 없다. 눈물이 나질 않아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의심해 본 적도 있다. 소시오패스 테스트를 하고서 야 안심했다. 나는 소시오패스가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
응급실에서 링거 줄을 달고 있는 고양이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꺼이꺼이 울었다. 고양이가 나를 보며 울었다. 나는 고양이를 보며 더 울 었다. 나는 울 수 있다. 바닥을 기며 꺼이꺼이 울어본 적은 없다. 그런 울 음은 드라마에서 노년의 성격파 배우들이나 연기로 보여주던 것이다. 그 런 건 연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울고 있었다. 연기하듯 울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고양이도 정신을 차릴 수 없다. 50% 확률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다. 혈전이 없어 져 뒷다리 마비가 풀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매일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고 링거를 놔야 할 것이다. 뒷다리를 계속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괜찮다. 나는 프리랜서니 24시간 옆에 붙어 있 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이 앞에서 꺼이꺼이 울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뺨을 후려쳤다. 고양이의 눈빛은 여전히 초롱초롱했다. 힘을 내 고 있는 것이다. 나도 힘을 내야 한다.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나는 지금도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내 고양이의 건강을 과신했다. 한 번도 병 을 앓아본 적이 없는 친구였다. 열여덟 살인데 여덟 살처럼 쌩쌩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나이 든 티가 어쩜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어째서 털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거죠? 정말 잘 키우셨나 봐요?” 잘 키우지 못했다. 심장이 약해진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하곤 했다. “기네스 신기록 깨려고요” 역사상 가장 오래 산 고양이는 서른여덟 살에 죽었다. 내 고양이가 서른여덟이 되면 나는 일흔이 된다. 일흔이 된 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마감을 하다가 “이놈의 고양이야 너는 어쩜 늙지도 죽지도 않니”라고 불평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까지 상상했다. 이놈의 고양이는 동반자였다. 연인이었다. 자식이었다. 모든 것은 내 탓이었다.
다음 날 자정,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의사가 말했다. “아무래도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까지 오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나는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고양이를 보자마자 나는 알았다. 밤을 넘길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누워 있는 고양이를 껴안았다. 고통에 숨을 헐떡이면서도 몸을 겨우겨우 내 쪽으로 돌렸다. 나는 얼굴을 고양이 얼굴에 붙였다. 내 숨이라도 주고 싶었다. 고양이 숨이 내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내 숨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네 숨을 나에게 주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오늘 밤에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아플 겁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고양이를 1시간 동안 껴안고 있었다.
내 고양이는 병원을 정말 싫어했다. 병원만 가면 ‘고양잇과 동물이 왜 맹수 중의 맹수인지 보여주지’라는 기세로 의사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검사를 위해 피를 뽑는 건 전쟁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양이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섬 집 아기〉를 불렀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홀로 남아 집을 보다가…” 흥얼거리고 있으면 이상하게 진정이 됐다. 그 사이에 의사들은 재빨리 고양이 앞다리에 주삿바늘을 꽂고 피를 뽑았다. 그 뒤로 고양이와 침대에서 함께 잠들기 전에 꼭 그 노래를 불렀다. 나는 죽음을 앞둔 고양이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 1시간은 오로지 나의 욕심이었다. 어떻게든 1시간이라도 함께 있고 싶었다. 보낼 수가 없었다. 고개를 가누지도 못하던 고양이는 잠깐 나를 봤다. 나는 들었다. 알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아니다. 나는 지금 내 고양이를 보낸 죄책감에 말도 못 하는 고양이 말을 알아들었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다. 내 고양이를 내 손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마지막 순간을 낭만화하고 있다. 이런 글을 쓰면서도 문장 사이사이 농담을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글쟁이로서의 습성도 버리지 못한 채, 내 고양이와의 마지막 순간을 과하게 꾸며대고 있다. 낭만적인 순간은 없었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나는 가슴을 치며, 말 그대로 가슴을 치며 말했다. “보내주세요.” 나는 나를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화장터로 들어가는 고양이를 도무지 볼 수가 없었다. 함께 간 친구가 말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을 직접 보는 게 좋을 거 같아.” 1시간 뒤 고양이는 재가 되어 돌아왔다. 오동나무 유골함에 곱게 들어간 고양이는 너무 가벼웠다. 나는 유골함을 선택하는 순간 같은 것이 내 인생에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장례지도사가 유골함 종류를 보여주며 가격을 말했다. 퉁퉁 부은 흐린 눈으로 봐도 도무지 예쁜 것이 없었다. 내 고양이는 예쁜 것을 좋아했다. 내 고양이 방석과 숨숨집과 스크래처는 조명과 가구를 고를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민을 거쳐서 선택한 것들이다. 그런 디자인을 즐기던 내 고양이를 그토록 촌스러운 유골함에 넣어야 한다는 건 용납이 되질 않았다. 나는 디자인을 포기했다. 그 대신 물었다. “평생 보관할 수 있는 유골함은 뭔가요?” 오동나무 유골함이었다. 봉인을 하면 영원히 곁에 둘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내 고양이는 오동나무 유골함에 들어가 내 품에 안겼다. 유골함을 껴안고 일주일을 잤다.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오로지 고양이를 위해 집을 꾸몄다. 고양이를 위해 방마다 러그를 깔았다. 양털로 된 러그를 곳곳에 놓았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창 앞에는 캣타워를 뒀다. 화장실 하나는 아예 고양이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고양이가 없는 집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일주일 뒤 나는 겨우 청소를 했다. 청소를 하다가 주저앉아 또 울었다. 러그 위에 고양이가 토한 자국을 도저히 닦아낼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 붙어 있는 털을 도저히 뗄 수가 없었다. 주인이 없어진 방석을 치울 수가 없었다. 밥그릇과 물그릇을 치울 수가 없었다. 이 집은 나를 위한 집이 아니었다. 고양이를 위한 집이었다. 쿠션과 소파와 의자와 소품마저도 내 고양이와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며 이 집을 완성해 왔다. 나의 맥시멀리스트 고양이는 죽었다. 내 집은 죽었다.
나는 온갖 오브제를 수집하면서도 고양이 오브제는 사지 않았다. 내 고양이가 있는 집에 고양이를 닮은 물건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아니다. 딱 하나가 있다. 이탈리아 할머니에게서 구입한 검은색 고양이 도자기다. 내 고양이와 닮은 구석도 없다. 대체 이걸 왜 구입했던 걸까. 인간은 종종 헛된 짓을 한다. 며칠 전부터 나는 이 고양이 앞에서 내 고양이 이야기를 주절거리기 시작했다. 헛된 일이다. 이 고양이는 말이 없다. 이름도 없다. 다만 눈동자와 몸집은 내 고양이를 닮았다. 나는 유골함을 이 고양이 옆에 둘까 한다. 내 고양이 이름은 솔로였다.〈스타워즈〉캐릭터에서 딴 ‘한솔로’였다. 모두가 그냥 솔로라고 불렀다. 솔로는 2007년 10월에 와서 2025년 10월에 갔다. 나를 완성하고 갔다. 이 집을 완성하고 갔다.
김도훈 @closer21
오랫동안〈씨네21〉에서 영화기자로 일했고, 〈GEEK〉의 패션 디렉터와〈허핑턴포스트〉편집장을 거쳐 《이제 우리 낭만을 이야기합시다》, 《나의 충동구매 연대기》라는 책을 썼다. 평생(?)에 걸쳐 수집한 물건들과 아름다운 물건들이 공존하는 그의 아파트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김도훈 나라다.
editor심효진
words김도훈
-
Array
(
[idxno] => 8348
[url] => /news/articleView.html?idxno=64894
[title] => 전통과 현대 그 사이, 시간을 쌓아올리는 이재하 작가
[target] => _self
[article_idxno_self] => 64840
[article_idxno_target] => 64894
[sort] => 0
[default_img] => 202511/64894_64880_2746.jpg
)
- 전통과 현대 그 사이, 시간을 쌓아올리는 이재하 작가